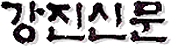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얼마 전 새로 이사한 아들 집에 꽃을 선물하러 화훼단지에 갔다. 단지 입구에서부터 봄꽃들이 각자 제 모양과 색깔을 뽐내며 올망졸망 신비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 수도 없이 많은 꽃 중에서 딱히 마음에 든 꽃을 고르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유난히 꽃을 좋아하는 며느리가 작고 귀여운 꽃 몇 개를 골라서 내 앞에 갖다 놓으며 "어머니, 꽃은 다 예쁘잖아요. 아무거나 사주세요. 잘 가꿔 볼게요." 말했다.
맞다. 모든 꽃이 다 예쁜데 꽃을 고르는 나의 편견이 마음에 드는 꽃 찾기가 어려웠던 거다.
지금은 사랑스럽고 예쁜 며느리를 처음 사진으로 보았을 때도 그랬다. 결혼할 나이가 찬 아들에게 사귀는 연인이 생겼다고 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아가씨일까 궁금해서 인사는 언제 시킬 거냐고 하루가 멀게 아들을 졸랐다. 좀체 대꾸가 없던 아들은 나의 성화에 못 이겨 직장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선생님 중의 한 명이라고 수수께끼에 힌트 던지듯 말했다. 나는 아들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근엄한 면접관이 되어 한 명 한 명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거나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편견의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젊고 예뻐서 한 명을 고르라고 한다면 결정하기 힘들 것 같다. 그중에 이 아가씨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얼굴이 있었다. 아들도 내세울 만한 조건이나 외모는 아니지만 내가 정해 둔 기준에 근접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아들이 결혼을 결정하고 며느리를 처음 소개받은 날이었다. 아들은 그 숱한 아가씨 중에서 하필 내 기준에 불합격 점수를 받은 아가씨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성격이 조금만 더 밝았으면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몸이 조금만 더 통통했으면 집안의 경제력이 괜찮았으면 부모님이 조금만 더 젊었으면 등 내가 바라는 모든 조건을 마음속으로 읊조리고 있었다.
아들은 이런 내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좋아서 싱글벙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다. 우리 젊었던 시절에는 결혼하려면 부모님께 선을 보여 부모님의 승낙을 받는 것이 순서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결혼을 할지 말지도 선택사항이 된 요즘은 결혼 상대를 정할 때에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는 일은 전설 속에서 나올 법한 일이 되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혼을 말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내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아들이 좋아서 골랐으니 둘이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애써 마음을 다독였다.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준비도 하면서 며느리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며느리는 소박하고 꾸밈없는 성격에 예의 바르고 똑 부러져서 얼어붙은 마음을 점점 녹이기 시작했다.
"엄마, 내 눈만 믿어보세요. 최고의 며느릿감이라니까요?" 내 마음을 훔쳐본 것처럼 가끔 능청스럽게 나를 달래던 아들의 위로가 아니라도 편견의 눈 때문에 구겨져 버린 며느리의 반듯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다.
우리는 수많은 꽃 중에서 각자 마음에 드는 꽃을 하나씩 골랐다. 가게 주인은 우리가 고른 꽃에 어울리는 화분에 꽃을 심어주었다. 각기 어울리는 화분에 심어서인지 꽃의 빛깔과 모양이 훨씬 예쁘게 보였다.
꽃을 고르느라 오랜 시간 서서 덤벙거렸더니 피곤해서 아들네 소파에 누워버렸다. 저녁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한들거리는 꽃들을 닮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