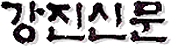설마, 고무줄 축제가 있을라고? 하지만 벅벅이 있다. 새퉁스럽게 수만 가지의 고무줄을 떠올리지는 말자. 코앞에 닥친 ‘제1회 영랑문학제’를 두고 한 말이었으니까.
지난 13일이었다. 갑자기 군청으로부터 전갈이 왔다. 요지는, ‘영랑문학제’를 앞두고 관내에 있는 3개 문학단체와 군수가 면담을 한다는 거다. 좋게 말해서 전갈이지, 순전히 ‘집합!’이었다.
점심나절에 연락해 놓고 저녁참에 모이라는 것하며, 1개 단체에서 3명씩 머릿수를 채우라는 것부터 군대 지휘관의 명령체계와 꼭 닮았지 않는가. 명령이지만 난 못 갔다.
집합보다는 앞선 열외의 선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심 자책이 컸었다. 문학인으로서 학수고대했던 영랑문학제가 열리게 됐는데, 난 그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박수를 보냈다.
지금까지 어느 단체장도 엄두를 못 냈던 행사를 추진했다는 점과, 또 늦게나마 문학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자 했다는 점 때문이다.
뒷날, 그날 모임 참석자를 찾았다. 어떤 지시전달사항(?)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서였다. 듣그럽겠지만, 집합의 의미가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낱말이다. 모르겠다.
그날 좋은 계획이 나와서 작금의 행사에 반영이 되었는지도. 하지만, 내가 그에게서 듣고 기억된 얘기는 딱 한 마디뿐이었다.
바로 이번 행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축제의 지원금이 3천만 원이 될 수도, 5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결국, 영랑문학제가 ‘고무줄 축제’라는 것 아닌가. 3천만 원 축제에서 5억 원 축제로 쭉쭉 늘었다 줄었다 하는.
나는 이 말을 두고 곰비임비 많은 생각을 했다. 이 영랑축제의 비전이 제대로 수립됐기는 했을까. 강진군의 최고 수장의 발언이 이랬다면, 그 행사를 주최하는 (사)영랑기념사업회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성공한 축제는 비전을 꼭지점으로 두고, 그 밑변에는 지속적인 관심, 참여, 투자가 팽팽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비전 제시도 없는 쭉쭉 줄었다 늘었다 하는 고무줄 행태를 보고, 누가 관심을 가질 것이며 참여를 할 것인가. 자칫, 전시행정의 앞잡이 축제로, 531지방선거용 축제로 전락해버릴지 걱정이 앞선다.
아무런 여론의 공청 과정도 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열린 축제이고, 몇 년 간 답보상태였던 (사)영랑기념사업회를 새로이 조직하고 끌어들인 것이 의심스럽지 않는가.
어쩌면, 그날의 회합이 저간의 염려를 무마하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른다. 자칭 타칭, 영랑의 후예라 할 수 있는 문학인들이 뒷짐 지고 있었으니 구설수도 있었겠다.
그렇다고 변한 게 있었을까? 아무 것도 없다. 왜냐? 단지 하명하는 집합일 뿐이었으니까.
내가 속한 단체는 정기총회 일자를 개막일로 잡았다. 그렇다고 그날 집합의 영향은 없었다. 우리들이 주인인데, 손님으로 뒤바뀌어버린 상실감을 털어내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뭔가 개운치 않다. 군(郡)수뇌부가 이 축제의 의미와 성격을 조금만 살폈더라면 이런 박탈감은 들지 않았을 것이다.
군(郡)은 축제 예산이 세워지고 난 뒤, (사)영랑기념사업회와 관내 3개 문학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 과정 없이 고스란히 (사)영랑기념사업회와 서울의 한 출판사인 ‘시와시학사’에 떠넘겼다가, 행사 보름을 앞두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 큰 절망이었던 것이다.
30년을 오매불망, 영랑 하나만을 바라봤던 강진의 문학인들에게는.
큰 축제를 앞두고 애써, 훌닦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침소봉대일 수도 있고, 한갓 투정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적잖은 군민의 혈세를 뽑아 집행하는 축제로 나아가는 마당에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축제의 마당이 민, 관, 군이 화합하는 곳이고, 문화의 저변을 다독이고 번창하는 곳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다시, 고무줄이다. 축제에 주인이고 손님이고 뭐 별반 다르던가.
가서 여울여울 즐기면 되는 거다. 우리는 주인으로든 손님으로든 참여하면 되는 거다.
그리하여 한없이 쭉쭉 늘어나는 축제로 만들어 보는 거다. 기억할 것은 고무줄처럼 힘아리 없이 팽,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해등<시인. 프리랜서>
<외부기고의 칼럼 내용은 본사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