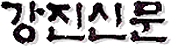김제권 _ 수필가

악마의 혀를 날름거리는 거센 불길을 잡기 위해 물대포를 쏘는 소방관의 얼굴엔 살신성인의 결의로 가득 차있다. 순직은 모두 숭고하지만 화재 진압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의 정신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옛적에도 시골집에 화재가 자주 일어났다. 헛간에 쌓아둔 잿더미에 불씨가 남아 있다가 바람을 타고 볏짚에 옮겨 붙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보자"란 말이 생겨났는데, 난데없이 70년대 "아침 일찍 산에서 내려오는 등산객 간첩인지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포스터 문구로 둔갑하기도 했다.
여름밤 모기가 극성을 피우면 외양간에 모깃불을 피웠는데 소가 뒷발질을 해서 불 깡통이 넘어져 화재를 일으키기도 했다. 초가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웃집으로 불씨가 쉽게 옮겨 붙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원이 망루에 올라 사이렌을 돌리며 화재를 알렸다.
사람들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을 확인하고 달려갔다. 사이렌 소리가 그치고 한참 뒤에 소방차가 덜컹거리며 비좁은 골목 사이로 들어선다.
동네 사람들은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러와 소방차 물통에 부으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어영차, 어영차!" 펌프 양쪽에 달린 막대를 힘차게 누르며 불길을 향해 물대포를 갈긴다.
외양간에 불이 나면 소는 꼬리에 붙은 불을 끄려고 아주 높게 뒷발질을 하며 뛰었다. 시골의 불구경은 재미있었다. 그러나 '불구경은 먹던 밥도 그만 두고 본다'는 말은 옛날 말이 되었다.
우리 마을은 향악의 네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인 환난상휼(患難相恤)을 잘 실천해 왔다. 불이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진화에 나섰다.
불길이 완전히 잡히면 온 동네사람들은 복구 작업을 서둘었다. 남자들은 검게 그을린 기둥과 서까래를 갈아 끼워 이엉을 새로 이었다. 여자들은 세간을 깨끗이 씻고 젖은 옷과 이불을 햇볕에 말렸다.
전소된 가옥을 새로 지을 때에는 남자들이 일손을 도와주고, 여자들은 가재도구와 식량을 가져다주었다.
그런 것이 옛 시골의 인심이었다. 눈이 내리면 동네아이들은 추위를 잊기 위해 마을 공터나 논 두둑 아래서 모닥불을 피웠다. 겨울 세찬 바람에 차가워진 손발을 모닥불에 쬐며 한마음이 되어 마주보며 히죽거리곤 했다.
나도 불장난을 하다 큰일을 저지른 경험이 있다. 초겨울 희끗희끗한 진눈개비가 하늘을 날다 냇물 위에 떨어졌다.
건너편 바위산 쪽에 하얀 눈보라가 바람을 타고 세차게 몰려 왔다. 동네 앞 둔치에 부모님께서 거친 자갈을 골라내고 퇴비를 넣어 만든 밭이 있었다. 밭 귀퉁이에 묶어 놓은 마른 콩깍지와 뽕나무 다발을 보자 따뜻한 모닥불 생각이 났다. 큼직한 돌로 사방을 막고 마른풀 위에 뽕나무 가지를 얹어 모닥불을 피우자 따뜻한 불기운이 주위까지 퍼졌다.
조그마하던 불이 갑자기 몸집을 키우더니 돌 틈으로 비집고 나와 마른풀에 옮겨 붙었다.
고무신에 물을 담아 퍼부었지만 불길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설상가상(雪上加霜) 한차례 회오리바람이 획 불더니, 불기둥을 만들어 삽시간에 멀리 있는 볏단으로 올라탔다.
불은 순간 소먹이 고구마 줄기 더미와 짚단 더미를 태워버렸다.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덮였다. 함께 불장난을 했던 친구들도 겁에 질려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책임을 떠넘기듯 주동자였던 나를 쳐다봤다.
주변에 더 이상 옮겨 붙을 곳이 없자 불은 스스로 꺼졌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 붙은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날이 저물어 집으로 가는 길은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몸에는 그을음 냄새로 머릿속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내가 큰불을 내서 남의 소먹이를 다 태웠다는 소문이 집에 이미 도착했다. 부모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향해 "뭘 잘했다고 우두커니 서있어? 벼슬하고 왔으니 시장도 하것다. 빨리 밥 묵어!"하시고 다른 말씀이 없으셨다. 꾸중으로 해결하기에 너무 큰일이었기에 용서해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 집 소먹이로 쌓아놓은 마른 고구마 줄기와 볏단을 내가 불태워버렸던 집에 몽땅 가져다 주셨다. 불의 위력을 일찍 체험했던 나는 지금껏 '자나 깨나 불조심!'을 되뇌며 살아간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