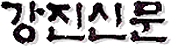김우진 _ 한자·한문 지도사
그것, 아마도 기(其)

"아마도 서이리라! 자기가 바라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이때의 기(其)는 '아마도'로 썼다. 다산의 사의재기(思宜齋記)에 보면, '기유부담(其有不澹 맑지 않음이 있으면)', '기유부장(其有不莊 단정하지 못함이 있으면)', '기유불인(其有不訒 말을 함부로 함이 있으면)', '기유부중(其有不重 신중하지 못함이 있으면)'의 내용이 있다. 이때의 기(其)는 '만약'으로 썼다.
기(其)의 갑골문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원래 其자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대나무로 역어 만든 '키'였다. 아래는 두 손이니 키질하는 모습이다. 그랬던 其가 본래의 뜻에서 멀어지자 여기에 주재료인 竹(대 죽)을 더해 '키 기(箕)'자를 새로 만들었다.
버릴 기(棄)

한편 棄(기)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 소개한다. 어머니가 거인의 발자국을 보고 낳았다고 하여 태어나자마자 세 번이나 버려진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말과 소가 밟지 않고 새들이 보호했다. 부모는 할 수 없이 데려와 키웠다. 그리고 이름을 棄(기)라고 불렀다. 기(棄)는 성장하면서 특히 농사를 잘 지었다. 마침내 후대사람들은 그를 농사(곡식)의 신 후직(后稷)으로 받들었다.
우리가 종묘사직(宗廟社稷)이라고 할 때의 직(稷)이 바로 棄(기)였던 것이다.
시원하다, 상쾌하다 상(爽)

헌데 한 순간 내게 찾아온 어떤 느낌들을 온전히 담아두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고대인들이 문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지점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상쾌하다'는 바로 그 느낌을 어떤 기호를 써서 표현해야 가장 잘 살릴 수 있을까?
고대의 문자천재는 겨드랑사이로 바람구멍이 숭숭 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서 '시원할 상(爽)'자로 들어가는 힌트를 얻은 것 같다.
끼다 협(夾)

눈에 보이는 물체를 이미지화해서 그곳에 뜻을 담았다. 그래서 문자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인간의 온갖 생각과 상상, 논리와 느낌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메타인지를 고차원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문자가 있었기에 더욱 가능했다는 설명도 있다.
협(夾)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몇 가지 글자를 파생시켰다. 협객(俠客)으로 쓸 때의 俠(의기로울 협), 협공(挾攻)이라고 말할 때의 挾(낄 협), 협곡(峽谷)이라고 표현할 때의 峽(좁을 협)이 그것이다. 夾(협)자에 사람(亻)과 손(扌)과 산(山)을 더해 만들었다.
눈썹 미(眉)

눈썹과 미간(眉間)은 관상에서도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눈썹은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그런 이유가 있어 최초로 眉(미)자를 만들 때 눈과 눈썹을 함께 그렸는지도 모르겠다. 중국 촉나라때 재주가 뛰어난 마(馬)씨 성을 가진 다섯 형제가 있었다. 그 가운데 흰 눈썹을 가진 맏이 마량(馬良)이 가장 돋보였다.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경우를 말할 때 쓰는 백미(白眉)는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꼬리 미(尾)

나는 여기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다. 왜 당시의 인간은 꼬리에 집착했을까? 라는 질문이다. 인간은 꼬리뼈가 있다. 먼 과거의 인간 조상은 진화과정에서 꼬리가 달렸던 때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장구한 시간 꼬리는 퇴화되어 의식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원초적 경험은 여전히 집단무의식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점을 인정한다면, 인간이 꼬리에 집착하는 현상을 심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장식이든 분장이든 무의식에 내재된 원초적 경험에 대한 집단적 표출로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