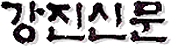서명숙 _ 방송작가

머릿속 엉킨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없어 '걷기'가 절실하던 어느 날, 낙향한 친구로부터 놀러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벚꽃 시즌을 놓쳐 계절의 흐름을 행인들 겉옷 두께로 가늠하며 지내던 차였다. 봄이 깊어가는 듯도 하고 봄이 떠나는 듯도 하던 4월 중순, 나는 강진행 버스표를 끊었다.
첫 날은 늦은 시간에 도착해 곧장 숙소로 향했다. 술을 마시다 지치고, 서울살이 고단함을 하소연하느라 지쳐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는 나를 노란 유채꽃이 반기는 가우도 출렁다리 앞으로 데려갔다. 마침 토요일이라 봄꽃만큼 다채로운 등산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출렁다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중년 남성 단체를 앞질러, 아들의 사진을 찍으려는 아버지의 카메라 앞을 잰걸음으로 지나, 잠시 바닷물을 구경하면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자매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언니로 보이는 이가 "부산에는 이렇게 좋은 데가 없는데~"라며 여행 계획을 짠 자매의 공을 추켜세우자, 또 다른 동생이 "없긴 왜 없어!"라며 부산의 명소를 몇 곳 읊었다. 동생의 말처럼 더 좋은 곳은 얼마든지 있긴 할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지금 이곳이 비할 데 없이 좋다는 언니의 말도 틀리진 않을 거다.
출렁다리의 끝에 도착하자 '향기의 섬 가우도'라는 산비탈 알림판이 보였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알림판 왼편의 해안 산책로를 택했고 나는 친구가 이끄는 대로 오른편의 산길로 접어들었다. 산길로 접어들자, 거짓말처럼 주변은 고요해졌다. 가끔 머리 위로 비명을 동반한 짚라인 이용자들이 지나가긴 했으나, 앞서 출렁다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호젓한 산책로였다.
친구는 올해 강진 관광 슬로건이 'A로의 초대'인데 우리가 걷는 곳이 바로 'A'자의 가로지른 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강진의 양편을 잇는 섬, 가우도 산책로는 여전히 봄이 한창이었다. 4월 말인데도 붉은 동백부터 활짝 핀 고사리, 봉우리가 질 듯 말듯한 산수국까지. 걷다보니 어느덧 대나무숲 사이로 가우도 마을의 지붕이 나타났다.
가우도 다음 코스는 강진의 북쪽 병영마을이었다. 전라병영성이 있고 하멜의 흔적이 남은 그곳도 독특한 돌담으로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실 10년 전 쯤 방송 때문에 취재한 적이 있던 곳이라, 한골목 길은 강진이 고향인 친구를 도리어 내가 안내하듯 앞장서서 걸었다. 그렇게 반나절 걷고 나니 휴대전화 어플에는 이미 1만 보가 넘은 것으로 기록됐다.
처음 강진에 내려올 때는 친구를 만나 속풀이를 하고 갈 참이었다. 풀어놓으면 고민도 끝날까, 싶어 단단히 준비하고 왔는데 정작 걷기 시작하니 그럴 맘이 생기지 않았다. 흙내음 흠뻑 맡고 꽃구경 실컷 하고, 자칫 놓칠 뻔했던 계절의 얼굴을 지긋이 보고 한없이 걷고만 싶었다. 지금 눈 앞에 없는 일에 골머리 앓다가 이 봄날을 놓쳤다면 얼마나 아쉬웠을까. 그러니 충분히 생산적인 산책.
점심으로 칠량면에서 봄 제철 바지락회를 먹으며 우리는 내친 김에 다음 여행지를 고르기로 했다. 친구가 "남도에서 또 어딜 가보고 싶냐?" 고 묻기에, 나는 한참 고민하다가 "유홍준 교수가 남도답사 1번지라고 했던 곳이 어디지?"하고 되물었다. 친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답했다. "거기가 여기. 강진!" 연꽃과 수국이 만개하는 곳도 있다니, 여름의 강진 산책도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