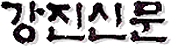김제권 ㅣ 시인·도암출신

몇 해 전 추석날 가족들이 모여 이듬해 한식날은 꼭 이장하기로 정했다. 약 120여 년 전 조상님들이 이름난 풍수와 명당자리를 찾아 산자락 중심에 안치 하셨던 산소로 갔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유골을 정성껏 수습하여 나무 상자에 담아 선영으로 모시고 왔다. 남자들은 땅을 파서 묻고 있는 동안 여자들은 먼 곳까지 가서 잔디를 사왔다.
헐어진 봉분에 부드러운 황토 흙을 퍼와 보충해주고 지난 여름 장마 때 빗물로 유실된 곳에 잔디를 심는 등 형제들이 공동 작업을 하는 동안 우애도 더욱 돈독히 쌓였다. 그 모습을 흡족하게 지켜보시던 어머니의 얼굴빛이 햇살처럼 환해 보였다.
우리 조상님들이 손이 없는 날이라 하여 묘지를 손질했던 한식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흥미롭다. 지금부터 2천 년이 넘은 이야기로 중국의 역사학자 사마천이 편찬한 『사기(史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춘추시대의 인물인 개자추(介子推)란 사람이 있었다. 진 문공(晉文公)과 19년간 망명 생활을 하던 중 공자가 몹시 배고파하자 이를 지켜보다 못해 자기 허벅지 살을 떼어내어 고깃국을 끓여드렸다.
진 문공이 왕에 즉위하여 옛날 함께 고생했던 신하들에게 땅과 벼슬을 내려 줬는데 개자추 이름만 빠져있었다. 그 길로 산속으로 들어가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다. 문공은 그를 찾기 위해 산에 불을 질렀지만 끝내 나오지 않고 불에 타죽었다. 문공은 개자추의 넋을 달래주기위해 이날은 화식(火食)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한식날은 음력 24절기 중 다섯 번째 절기로 춘분과 곡우 사이에 들어있기에 얼어붙었던 대지에 온기가 치솟고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맑고 화창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기에 적당한 시기이다.
지금은 영농기술이 발달되어 벼 모종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여 그 전보다 시기를 훨씬 앞당겨 모내기를 하지만 옛적엔 한식날이 되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논둑과 밭둑에 불을 지르고 구멍을 막는 등 손질하고, 황토 흙을 논으로 옮겨와 못자리판을 만들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이 품앗이로 심어 놓은 여린 모가 여름 뜨거운 햇살을 받아 몸집을 키워 가을이면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다.
어머니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하얀 두루마기를 꺼내어 빳빳하게 풀을 먹이고 다림질하여 윗목 횃대에 걸어놓았다. 첫서리가 내릴 무렵이면 아버지께서 중절모에 하얀 두루마기 차림으로 십리길 이상을 걸어서 시제에 참석하고 다녀오실 무렵은 어두컴컴한 때였다. 아버지 손에는 지푸라기로 엮어 만든 꾸러미가 항상 들려 있었다. 식구들이 찰떡과 삶은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었던 생각이 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했듯이 시제의 풍속도 많이 달라졌다. 대부분 문중들이 시제에 참석하는 인원이 해마다 줄어든다고 한다. 재원이 넉넉한 문중에서는 시제에 참석한 사람에게 옛날 꾸러미 대신 촌지를 두툼하게 준다고 한다. 오랜 세월 우리들의 뼛속에 스며든 미풍양속이라 할 수 있는 조상님을 모시는 시제 모습이 변질되었다는 씁쓸한 기분이 들지만 급속히 달라진 대표적 이유가 장묘문화의 변천에 있는 듯싶다. 통일신라시대까지는 불교의 법식에 따라 화장이 성행했지만 조선시대부터는 화장이 전면 금지되었기에 매장이 대세를 이뤘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정부에서 화장을 적극 권장하므로 납골과 수목장(樹木葬)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무질서하게 산재된 묘지의 면적은 매우 넓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후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염려되는 것은 급속한 장묘문화 변화로 인해 오랫동안 계승해왔던 아름다웠던 민족의 혼이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