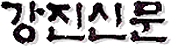戒 行 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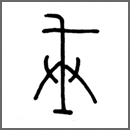
'경계할 계(戒)'자는 두 손으로 창을 들고 있는 그림에서 시작되었다. 현재의 글꼴인 계(戒) 역시 두 손으로 받드는 것을 뜻하는 '廾(공)'과 '창 과(戈)'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화적인 요소는 상실되었지만 여전히 갑골문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두 손이 주는 상징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전에 경계해야할 일이 한 가지 있다. 송대 이후 유교의 엄격한 윤리관에 갇힌 시각이다. 근래에 들어와서 비록 그것이 많이 약해졌다하나 은연중 우리의 사유를 한 방향으로 수로화(水路化)시킨다. 그만큼 뿌리가 깊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돌아가서, '막아서 지키다'를 의미하는 글자에서 왜 한손이 아닌 두 손을 그려 넣었을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먼 옛날에도 경계(警戒)가 최고조의 감각기능과 정신능력을 동원해야하는 행동임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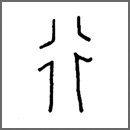
'행할 행(行)'자는 '사거리', 즉 길을 형상화한 글자다. 길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교통수단으로서의 길이다. 인류는 길을 통해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해왔다. 처음에서 지상의 길에 전적으로 의존했지만 어느덧 바닷길과 하늘 길을 활짝 열었다. 둘째는 방도를 나타내는 길이다. 교통수단이었던 길은 어떤 일에서 취해야 할 수단이나 방법을 뜻하는 방도(方道)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무슨 길이 없을까?', '손쓸 길이 없다.'라고 할 때의 길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는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길이다. 사람은 이 길을 알기 때문에 동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이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다.'라고 할 때의 '길'이다. 사유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길에 맞아야 너와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편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제 더 이상 손쓸 길은 없는 것인가'라는 자조(自嘲) 섞인 탄식이 줄어드는 사회를 꿈꾸는 이유다.
旦 暮 단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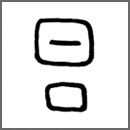
우리가 보는 태양은 두 개일 리가 없다. 그러나 하루에 딱 한 번 태양은 두 개가 된다. 일출(日出)때이다. 그것도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출이다. 한자에는 태양이 두 개인 글자가 꽤 있다. 뒤에 언급할 '저물 모(暮)'를 비롯해서 '어두울 암(暗)', '쬐다 폭(曝), '더울 서(暑)등이 그것이다. 이런 글자들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의도적인 조작에 의해 하나의 해가 더해진 경우다. 그러나 '아침 단(旦)'은 다르다. 처음부터 두 개의 해로 시작했다. 눈길을 갑골문으로 돌려보자. 위는 수면위로 떠오른 태양이다. 아래는 물에 비친 태양의 그림자다. 하나의 태양이 둘로 보이는 일출의 광경을 포착해서 만든 글자가 바로 단(旦)인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해 그림자는 지평선으로 대체되었다. 동태적인 일출이 정태적인 일출로 변해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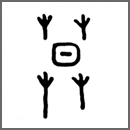
해가 수풀사이로 숨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다. 이 글자가 만들어진 처음에는 날이 저문다는 의미를 '해'가 하나인 글자 '莫(막/모)'으로 썼다. 그러다가 莫자가 '없다', '하지 말라' 등을 의미하는 부정사로 쓰이게 되자 '저물다'를 살리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물 모(暮)'이다. 莫(막)에 해(日)를 하나 더 첨가했다. 지금이야 심야까지도 인간의 활동은 멈출지를 모르지만 수천 년 전에는 해가 떨어지면 하던 일을 그만 두어야 했다. 지금과는 다른 고대의 환경과 莫(막/모)이 부정사로 변한 것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莫(막/모)을 소리(聲:소리 성)부호로 하고 그 외 나머지를 의미부호(形)로, 즉 형성의 원리를 활용하면 10여자의 한자를 금방 익힐 수 있다. 먼저 '막'을 보면 장막 막(幕), 사막 막(漠), (눈)꺼풀 막(膜), 고요할 막(寞)이 있다. 다음의 '모'는 본뜰 모(模), 뽑을 모(募), 그리워 할 모(慕), 꾀 모(謨), 모호할 모(模), 더듬을 모(摸)가 있다.
遲 攻 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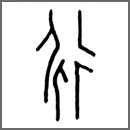
더딜 지(遲)자는 '서(犀)'와 '착(辶)'으로 이루어진 글자다. 서(犀)는 무소를 지칭하는데 무소는 곧 코뿔소를 말한다. 착(辶)은 '쉬엄쉬엄 가다', '달리다', '뛰어 넘다' 등의 뜻을 품은 의미요소다. 동작을 나타낸다. 지(遲)자는 육중한 코뿔소가 풀을 뜯으면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연상되는 글자다. 해서 약간의 관찰력만 있다면 현재의 글꼴로도 '더딤'이라는 의미의 도출은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일상에서 지각(遲刻), 지체(遲滯), 지연(遲延)등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 글자는 그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희한하게도 소(牛)는 보이지 않는다. 고대인은 '길거리(行)'와 '두 사람'을 그려 지(遲)를 표현했다. 갑골문은 사람이 사람을 업고 가는 모습이다. 흥미로운 점은 업힌 사람이 업은 사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갑골문의 매력은 바로 이런 것에 있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업었으니 어찌 그 발걸음이 빠를 수 있겠는가.

'치다 공(攻)'자는 공(工)과 복(攵)으로 이루어진 글자다. 우리는 흔히 공(工)을 물건을 만드는 '장인'으로 알고 있지만 갑골문에서 보듯 그것은 장인들이 사용했던 일종의 작업대였다. 복(攵)은 손잡이가 긴 망치와 그것을 들고 있는 손에서 시작된 글자다. 복(攵)이 지니고 있는 '치다', '때리다'의 의미가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갑골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초의 문자 발명가는 작업대와 쇠망치를 든 손만을 클로즈업 한 것이 아니다. 내리칠 때 나는 소리까지 잡아냈다. 작업대 아래 조그만 세 점이 그것이라고 본다. 쇠와 쇠가 맞부딪치는 소리는 대장간의 전체풍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귀로는 들리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소리를 점이라는 시각적 단서를 통해 실상으로 올려놓았다. 그래서인지 공(攻)자는 지금도 어디서든 힘과 쇳소리를 동반하는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