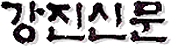갑골문자(甲骨文字)는 중국 고대 문자로서 거북이의 배딱지(龜甲)와 짐승의 견갑골(獸骨)에 새겨진 상형문자를 말한다. 거북이 배딱지(腹甲)를 나타내는 갑(甲)자와 짐승의 견갑골을 표현한 골(骨)자를 합하여 갑골문(甲骨文)이라고 말한다. 발견된 지역의 명칭을 따라 은허 문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갑골문자는 상형문자이고 한자의 초기 문자 형태에 해당한다. 한자의 원류를 알 수 있는 갑골문자를 통해 한자에 대한 기본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禽 獸 (금수)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 종종 뉴스에 난다. 금수(禽獸)는 날짐승과 길짐승을 뜻하니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란 뜻이다. '날짐승 금(禽)'은 위는 '그물'이고 아래는 '자루'이다. 자루를 잡고 있는 손을 추가하기도 했다. 금문에 와서 발음기호 '이제 금(今)'이 더해지면서 禽(금)을 '금'으로 읽게 되었다.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를 형성자(形聲字)라고 하는데 한자의 70%이상이 여기에 속한다. 그물은 바다에서는 물고기, 육지에서는 짐승을 잡는 도구다. 따라서 禽(금)자의 본래 뜻은 '사로잡다'였다. 그러다가 차츰 새를 잡는 도구로 단순화되면서 '날짐승'이 주된 뜻이 되고, '사로잡다'는 주전에서 밀려났다. 삼국지에서 제갈량은 반란군 두목 맹획을 일곱 번 놓아주고 일곱 번 사로잡아 마침내 부하로 삼는다. 그 유명한 칠종칠금(七縱七擒)의 고사다. 여기에 등장한 '사로잡을 금(擒)'은 禽(금)자에 '손 수(扌)'를 더해 만든 글자다. '사로잡다'가 이 擒(금)자와 함께 다시 돌아온 것이다.

'길짐승 수(獸)'는 사냥도구와 개(犬)의 합체자이다. 앞부분 V자형 끝은 매달아 놓은 돌이고 중간에 보이는 것은 그물이다. 치고 비틀고 씌우는 다목적용 사냥 도구인 것이다. 옆의 개는 당연히 성질 사나운 사냥개였을 것이다. 獸(수)의 본 뜻은 '사냥하다'였다. 그러다가 사냥으로 잡힌 '짐승'으로 그 뜻이 전이되자 '사냥하다'의 뜻을 가진 글자를 새로 만드는데, 그 글자가 '사냥할 수(狩)'이다. '개(犭)'와 '지킬 수(守)'를 합쳤다. 수많은 글자가운데 하필 수(守)였을까. 수(守)는 '지키다' 외에 '손에 넣다'라는 뜻도 함께 품은 글자여서 그랬던 것 같다. 아무튼 갑골문을 통해 '개'는 적어도 33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간과 변함없는 파트너관계였음이 확인되었다. 대단한 인연이다. 옛사람들은 인간과 금수(禽獸)의 차이는 덕(德)의 유무(有無)로, 인간과 인간의 차이는 덕(德)의 대소(大小)로 판단했다. 덕(德)은 시대를 넘어 동서양을 관통한다.
朝 野 (조야)

3300년 전 은나라 지식인들은 추상화의 대가(大家)이기도 했다. 그들은 하나의 그림만으로 뜻을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 2개 이상의 그림을 적절히 조합하여 추상적인 뜻을 담아냈다. '아침 조(朝)'는 초원(草原)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日), 그리고 서쪽 하늘에는 아직 지지 않은 희미한 달(月)로 묘사했다. 이른 아침을 소재로 한 밑그림을 보는 것 같다. 그림에도 포인트는 있는 법,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림의 주제가 '이른 아침'임을 알 수 있도록 희미한 달을 선(線) 하나로 묘사한 재치가 돋보인다.
이후 신하된 자들은 아침 일찍 조회에 나가 임금께 문안드려야 한다는 데서 '알현하다'는 뜻이 생겨났다. 또 임금을 모시고 나라의 정치를 의논하고 집행하는 곳이라는 데서 '조정'이라는 뜻도 더해졌다. 점점 뜻이 확대되어 '임금의 재위기간'을 나타내고 하나의 '왕조'를 칭하는데 까지 이르게 된다. 조(朝)는 '아침'에서 '왕조'까지 다양한 뜻을 담아내면서도 '아침'이라는 처음 뜻은 끝까지 지켜냈다.
들 야(野)

豐 年 (풍년)

'풍년/풍성할 풍(豐)'은 글자답게 그 설(設)도 풍성이다.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풀 모양을 본뜬 '봉(丰)'과 '위가 터진 그릇 감(凵)', 그리고 '제기(祭器)를 의미하는 두(豆)'의 조합으로, 풍년들게 해준 하늘에 감사하며 햇곡식을 다발 채 제단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다. 아니다 윗부분은 '쌍옥 각(珏)'이고 아랫부분은 술이 달린 '북(鼓)'으로, 제사 지낼 때 옥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모습이라는 것이다. '풍성하다'는 의미로 보면 어느 주장이든 일리가 있다. 하지만 풍년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첫 번째 주장에 은근히 마음이 간다.
요즘은 豐(풍)대신 豊(풍)을 주로 쓰는데, 사실 豊(풍)은 豐(풍)의 속자이면서 禮(예도 예)의 본자(本字)였다. 처음에는 禮를 豊(예)로 썼던 것이다. '요염(妖艶)하다'의 艶(염)자는 '풍성할 풍(豊)'과 '빛깔 색(色)'이 만났는데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 같다.

'해 년(年)'은 배부름과 관계있는 글자다. 잘 익어 고개 숙인 벼를 상형한 '벼 화(禾)'와 그 '볏단을 등에 지고 있는 사람'을 묘사했다. 따라서 年(년)자의 본래 뜻은 '수확'이었다.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을 고대사회에서 잘 익은 벼를 수확하는 일만큼 기쁜 일은 없었을 것이다. 가족의 배부름이 달린 한 해의 농사를 잘 마무리하고 느끼는 가장(家長)의 안도감을 어디에 비할까. 年(년)자가 갖고 있는 '해'라는 뜻은 이러한 사연도 함께 녹아들어가서 생겨난 산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 '해'의 뜻은 당시의 벼농사가 일모작인데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갑골문의 年(년)과 비슷한 구조로 벼(禾) 아래에 아이(子)가 들어가면 계절(季節)이란 단어에 쓰는 '철 계(季)'가 된다. 아이가 크듯이 벼가 자라는 모습에서 '시간의 마디'를 유추해내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벼 화(禾)에 입 구(口)를 합하면 '화목할 화(和)'자가 된다.